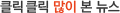3월에서 4월 초순경, 장고항 어부들의 몸짓이 부산하다. 실치잡이를 해야 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실치가 적게 나올 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물을 올리지만 많이 날 때는 수시로 바다에 나가 작업을 해야 한다.
흰 몸에 눈 점 하나 있는, 애써 눈여겨봐야 할 정도로 작은 물고기인 실치가 작은 몸을 흐느적거리면서 장고항 앞바다를 회유한다. 실치는 장고항의 봄의 전령사다.
 |
해돋이를 보는 것으로 하루해를 시작하려 한다. 오전 여섯 시가 채 못 돼 부스스 일어나 장고항 우측 끝자락의 노적봉과 촛대바위가 잘 보이는 위치를 찾는다.
마치 뫼 산(山) 형태의 기암은 장고항의 지킴이다. 오랫동안 먼 바다로 조업 갔다 오는 어부들에게 안도의 버팀목이 돼줬을 것이다. 이 계절, 기암 사이로 멋지게 떠오르는 해돋이를 기대하진 않는다.
단지 장고항을 대변해주는, 육지 끝자락에 있는 모습을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다. 물이 빠져 갯벌을 다 드러낸 서해에서 바라보는 일출. 동해에서와는 사뭇 느낌이 다르다. 아침 햇살은 빠르게 사위를 밝게 해준다.
서둘러 장고항 마을로 들어선다. 장고항은 ‘지형이 장고의 목처럼 생겼다’ 해서 ‘장고목’이라 불리다가 후에 장고항 마을이라 개칭됐다.
서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닷가 마을인 장고항이 특히 유명해진 것은 ‘실치’ 덕분이다.
마을 안쪽 건조대에는 실치포 말리는 작업이 한창이다. 오랫동안 실치포를 만들었음을 느끼게 하는 재래적인 작업장이다. 장고항 사람들은 1970년대 초 실치잡이가 본격화되면서 다들 실치포를 말렸다.
 |
| 실치잡이배. |
장고 목처럼 생겨 ‘장고목’, 실치로 명성
실치잡이가 성행할 때는 150여 가구가 소위 멍텅구리배로 불리던 무동력 중선으로 실치 잡이를 해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연안에서 실치 잡이 어선이 자취를 감췄다.
지금은 인근 앞바다에서 개량 안강망 그물로 실치를 잡는다. 실치포 만드는 작업은 눈으로 봐도 힘겨워 보인다. 마치 김 한 장 만들듯이, 물에 담긴 실치를 그릇에 적당량 떠서 사각형의 나무틀에 실치를 끼얹고 납작하게 펴서 모양을 잡는다.
연륜이 깊고 숙련된 사람일수록 실치 양을 정확히 가늠하고 금세 평평하게 만든다. 발에 붙은 실치는 신기하게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다.
해풍 맞으면서 몇 시간만 건조시키면 실치포가 완성된다. 두껍고 살색이 흴수록 좋은 실치포란다. 기꺼이 실치포 몇 묶음을 산다.
건조대를 지나 마을 끝 방파제 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수산물유통센터를 만난다. 2012년에 개장한 곳으로 7209㎡의 부지에 1153㎡의 1층 건물로 20여 곳의 횟집이 있다.
난전, 포장마차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간판을 달고 한곳에서 영업하고 있다. 싱싱한 활어는 말할 것도 없고 실치와 간재미 등이 지천이다.
오는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일까? 바닷물 담은 고무대야 속에는 실치가 살아 헤엄친다. 흰 몸에 점 하나 있는, 실 가닥 같은 물고기가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할 따름이다.
“나 살아 있어요” 소리치는 듯하다. 횟집들마다 부산하게 실치를 씻으며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 없다.
실치 씻는 방법도 아주 특이하다. 튀김 건질 때나 쓰는 긴 나무젓가락으로 휘휘 저어댄다. 젓가락에 실치회가 걸쳐지면 소쿠리에 담아내는 일을 반복한다. 워낙 작은 물고기라서 손품도 많이 필요하다.
 |
| 실치 말리기. |
수산센터를 비껴 방파제로 가는 길목에서 멀리서만 봤던 기암을 가까이서 조우한다. 붓을 거꾸로 꽂아놓은 듯한 바위가 촛대바위다. 양쪽으론 기암이 감싸고 있는데 바다 쪽 높은 바위를 노적봉이라 부른다.
바다 쪽으로 내려서서 산을 좌로 돌아가면 석굴(해식동굴)이 있다. 용천굴이라고 부르는데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천장이 뻥 뚫려 하늘이 보인다.
이어 올망졸망 배가 매어 있는 선착장으로 다가선다. 조업을 마친 배들이 들어오고 몇 팀의 낚시꾼들이 부산스럽게 배를 타고 떠난다.
행여 남편의 고깃배가 들어오는지를 고개를 외로 꼬고 기다리는 아낙도 있고 일찍부터 막걸리 한 사발로 술추렴하는 사람들도 만난다. 그물망에 걸린 실치 작업이 한창인 어부를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부들은 실치 철이 끝날 때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닷가에 나가 작업할 것이다. 적게 나올 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물을 올리고, 많이 날 때는 수시로 그물을 털 것이다. 여행객에겐 그저 볼거리지만 그들에게는 생계이자 돈줄이 아니던가?
 |
| 판매되는 실치포. |
 |
| 실치. |
초봄 한 달 먹을 수 있는 ‘반짝 요리’, 실치
이제는 ‘당진 8미(味)’ 중 하나로 꼽히는 실치회를 먹어야 할 시간이다. 실치회 한 접시를 시킨다. 요리는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아주 작은 흰색 물고기가 무더기로 뒤섞인 채 깨소금, 참기름, 파 등 양념이 흩뿌려진 것과 오이, 깻잎, 쑥갓, 당근 등 갖은 야채에 고추장 양념으로 무친 것이 있다. 실치와 야채를 함께 쓱쓱 버무려 입에 넣기만 하면 된다. 미끄러워서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 한다.
실치회를 집어 한입 먹는다. 비린 맛이 없고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진 야채와 어우러져 입 안이 상큼해진다. 작은 물고기라서 씹히는 맛 없이 그저 살살 녹아든다.
아욱을 넣어 끓여낸 고소한 실치국에 실치전, 실치달걀찜까지 먹으니 더부룩 배가 부르다.
 |
| 함실치회/실치회무침 |
그런데 궁금증은 아직 남아 있다. 도대체 실치란 무엇일까? 실치를 통상 ‘뱅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베도라치’라고 한다. 서해에서는 대부분 흰베도라치가 차지하는데 실치는 ‘흰베도라치 새끼’란다.
그래서 뱅어보다는 실치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것이다. 베도라치라는 그 이름을 외우려면 시간깨나 필요하겠다.
첫 그물에 걸려드는 실치는 너무 연해서 회로 먹기는 어렵다. 3월 말부터 4월 초순경 적당히 커져야 횟감으로 적당하다.
실치는 6월 말까지 잡히지만 4월 중순이 넘으면서 뼈가 굵어져 제 맛을 잃는다. 그래서 실치회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은 약 한 달로 눈 깜짝할 새다.
실치는 성질이 급해 잡은 지 얼마 가지 않아 죽는다. 당연히 먼 곳까지 운반할 수 없기에 산지에서나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다.
이후부터 잡히는 물고기는 실치포를 만든다. 멸치처럼 살짝 데쳐서 말린다. 특히 실치포는 칼슘이 풍부한 건강식이다.
집에 돌아와 장고항에서 구입한 실치포로 밑반찬을 만든다. 간단한 요리법이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포를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 구워낸 것이 전부다.
노릇노릇 구워낸 실치포는 바삭바삭 과자처럼 부서지면서 고소함이 퍼진다. 과장 없이 놀라운 맛이다. 장고항의 바다 향이 집 안까지 이어진다.
 |
| 당진향교. |
 |
글 · 이신화 여행작가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