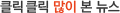|
| 바람이 매섭다. 가만히 서 있기조차 버겁다. 진눈깨비라고도 할 수 없는, 유리가루 같은 눈들은 바닥에 채 내려앉지도 못하고 공중으로 흩어진다. 안개처럼 반짝이는 눈가루를 비집고 투명한 겨울 햇살이 스민다. 펑펑 쏟아지는 함박눈을 기대하고 나선 길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겨울에 찾는 대관령은 언제나 정답이니까. |
 |
| 아흔아홉 굽이 대관령 옛길 |
| 대관령은 강원도 평창과 강릉의 경계에 솟았다. 한반도의 척추라 불리는, 백두산과 지리산을 잇는 백두대간의 중간쯤 되는 위치다. 동해를 바라고 선 대관령을 기준으로 동쪽을 영동, 서쪽을 영서라 부른다. 일기예보에 흔히 나오는 영동과 영서의 영(領)이 바로 대관령을 가리킨다. |
 |
| 대관령을 넘는 고갯길이 대관령 옛길이다. 아흔아홉 굽이 대관령 옛길은 ‘대굴대굴 구르는 고개’라 해서 대굴령이라 불렸다. 걷다가 미끄러져 구르고, 또 걷다가 미끄러져 굴러야 간신히 넘을 수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이 험한 길을 통해 강릉과 평창이 만난다. 동해에서 잡힌 해산물은 대관령을 올라 영서지방으로 퍼져 나갔고, 영서지방에서 생산된 토산품은 평창에서 시작되는 이 길을 따라 구산장과 연곡장 등으로 넘어갔다. 어디 물품뿐이랴. 어린 율곡은 어머니 신사임당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고, 송강 정철은 이 길을 지나 관동 지역을 유람했다. 청운의 꿈을 품고 한양으로 향했던 수많은 선비들의 발자국이, 등짐 들쳐 멘 보부상들의 굵은 땀방울이 모두 이 길 위에 화석처럼 남았다. |
![[왼쪽/오른쪽]반정 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 /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동상을 차지한 반정의 화장실](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012/20170105_03.jpg) |
| 대관령 옛길은 옛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던, 지금은 456번 지방도로 바뀐 도로변 반정을 들머리 삼아 걷는다. 주차 공간이 여유롭고 화장실과 전망대가 있어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당하다. 대관령 옛길을 알리는 큼직한 표석을 지나 짧은 나무 계단을 내려서면 본격적인 옛길 걷기가 시작된다. 수묵화처럼 은은한 풍경 속으로 내딛는 걸음에 설렘이 묻어난다. |
![[왼쪽/오른쪽]대관령 옛길을 알리는 이정표 / 대관령 옛길은 전체 구간이 완만한 내리막으로 이어진다.](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012/20170105_04.jpg) |
| 반정에서 대관령박물관까지는 6km 남짓.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길의 대부분이 완만한 내리막이라 누구나 편하게 걸을 만하다. 다만, 대관령 일대가 워낙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보니 눈길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는 게 좋다. 신발에 눈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스패츠와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이젠, 등산 스틱 등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준비 운동도 필수다. 대관령 옛길은 일반 등산로와 달리 전체 구간이 내리막이기 때문에 출발 전, 무릎과 발목 등 관절 부위를 충분히 풀어주는 게 좋다. 겨울 트레킹에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부족한 것보다 모든 면에서 조금은 넘치게 준비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옷은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일정은 여유롭게 잡아야 한다. |
| 어머니 품처럼 아늑한 길을 걷다 |
 |
| 길이 참 순하다. 완만한 비탈도 그렇지만 넉넉한 품과 급하지 않게 돌아가는 길이 마치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다. 정상을 목표로 발끝만 보고 걷는 등산이 직선이라면, 대관령 옛길은 곡선에 비유할 만하다. 누구의 걸음도 넉넉히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곡선. 어디 한 곳 모난 데 없는 둥근 공처럼 단 한순간도 거칠게 몰아세우지 않는 대관령 옛길은 전체 6km에 이르는 구간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늘 한결같다. 물론 아주 간혹, 조금 가파르게 내려선다 싶은 곳도 있다. 하지만 그런 곳엔 어김없이 나무 계단이 설치됐고, 다리가 뻐근해질 만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쉼터가 나온다. 또렷이 이어지는 길도 고마운데, 갈림길까지 없으니 길 잃을 염려도 없다. 덕분에 아무리 느긋하게 걸어도 산길을 벗어나는 데는 2시간이면 족하다. |
 |
 |
| 옛길로 접어들면 무섭게 불어대던 바람이 잠잠해진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부는데, 바람이 머리 위로 지난다. 능선과 능선 사이로 길이 움푹 들어앉은 까닭이다. 길 양 옆의, 어른 키를 훌쩍 넘는 언덕이 천연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겨울 트레킹에서 바람처럼 곤혹스러운 것도 없다. 하지만 머리 위로 부는 바람은 거친 숨소리만 위협적으로 토해낼 뿐 산객의 옷 속을 파고들지는 못한다. 가끔 불어오는 맞바람이 되레 반가울 정도다. |
 |
 |
| 어머니 품처럼 아늑한 길을 걷다가 갈증이 날 때쯤, 아니 솔직히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이 생각날 즈음이면 거짓말처럼 아담한 초가 한 채가 모습을 드러낸다. 맞다, 주막이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어이, 주모! 여기 탁배기 한 사발하고 국밥 좀 내오슈”라고 한 마디 던지고 싶은 꼭 그런 분위기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곳에 주모는 없다. 주모 없는 주막에서 산객의 갈증을 달래는 건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약수뿐. 널찍한 평상에 큰 대자로 누워 바라본 하늘이 시린 약수만큼 푸르다. 유리가루처럼 반짝이는 눈발이 바람에 실려 얼굴 위로 떨어진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뜨끈한 황태해장국에 메밀막걸리 한 잔 걸쳐야 할까 보다. |
![[왼쪽/오른쪽]복원해놓은 주막 / 주막 터에 있는 약수](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012/20170105_10.jpg) |
 |
| 주막 터가 있는 상제민원터를 지나면 길은 아예 평지라 불러도 좋을 정도로 평탄해진다. 자박자박 밟는 재미가 있던 눈길도 흙길로 바뀐다. 은근슬쩍 옆구리를 파고든 계곡이 없었다면 무척 심심한 길이었을 테지만, 바짝 다가선 계곡은 고맙게도 끝까지 길동무를 자처하고 나선다. 여름이었다면 그 성의를 봐서라도 잠시나마 곁에 앉아 발 담그고 쉬어갔겠지만, 계절이 계절인지라 탁족의 행복은 다음 기회로 미뤄둔다. |
![[왼쪽/오른쪽]주막 터를 지나면서부터 길동무가 되어준 시원한 계곡 / 계곡 길은 흙길과 테크 길이 번갈아 이어진다.](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012/20170105_12.jpg) |
| 흙길과 데크 길을 번갈아가며 계곡과 나란히 걷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며 걸음을 옮기다 보면 대관령 옛길의 명물(?) 우주선 화장실이 있는 하제민원터에 닿는다. 실질적인 대관령 옛길은 이곳에서 끝이 난다. 하지만 이곳에서 대관령박물관까지, 혹은 강릉바우길 2구간이 끝나는 보광리 자동차마을까지 내쳐 걸어갈 수도 있다. 하제민원터에서 대관령박물관까지는 1.4km, 보광리 자동차마을까지는 7.1km 정도다. |
여행정보
대관령 옛길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1 일대
문의 : 033-738-3000
|
| 글, 사진 : 정철훈(여행작가) |
|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왼쪽/오른쪽]반정 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 /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동상을 차지한 반정의 화장실](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012/20170105_03.jpg)
![[왼쪽/오른쪽]대관령 옛길을 알리는 이정표 / 대관령 옛길은 전체 구간이 완만한 내리막으로 이어진다.](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012/20170105_04.jpg)





![[왼쪽/오른쪽]복원해놓은 주막 / 주막 터에 있는 약수](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012/20170105_10.jpg)

![[왼쪽/오른쪽]주막 터를 지나면서부터 길동무가 되어준 시원한 계곡 / 계곡 길은 흙길과 테크 길이 번갈아 이어진다.](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012/20170105_12.jp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