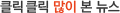정립(鼎立)은 ‘솥의 세 발처럼 서다’라는 뜻으로, 세 사람 또는 세 세력이 솥의 발과 같이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발의 각도가 120도를 이루는 자세는 다른 어떤 형태보다 안정과 균형을 상징한다. 삼각대나 삼발이의 발이 세 개인 것도 같은 이치(理致)이다.
현재 국민안전처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을 바로 정립(鼎立)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의 발은 재난안전 정책의 제도와 법이다. 또 하나의 발은 국민안전처의 기능과 역할이다. 세 번째 발은 국민 안전의식 수준이다. 이 세 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하지만, 정립(鼎立)에도 안정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세 발은 길이와 굵기에 있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하나의 발이 짧거나 가늘다면 균형된 힘으로 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국민안전처 내부적인 조건인 첫 번째 발과 두 번째 발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외부적인 조건인 세 번째 발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기간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온다고 바로 물이 고이기는 어렵다.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 양 이상의 비가 내리고 땅으로 스며든 뒤 물이 고인다.
국민안전처도 마찬가지이다. 3개의 조직이 결합하여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안되었다. 다양한 임무와 성향을 가진 3개 조직을 결합하여 선 순환적으로 능력을 끌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 발이 작동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하다. 국민안전 의식을 완전히 바꾸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60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 안전의식을 몸으로 터득하고 다시 그의 자식세대에게 체화시키는데 두 세대가 흘러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습관은 머리가 아닌 몸에 배어져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을 때 안전의식이 정착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들은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안전처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 일응 맞는 이야기다.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 해경이 초동대응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단순히 사고 뒤처리하는 부처가 아니다. 대형교통사고, 원자력 사고, 감염병, 화학물질 사고 등 복잡한 재난에 있어 주관기관과 유관기관을 종합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중앙과 지방,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역할이 더욱 근본적이며 중요한 기능이라 하겠다.
국민안전처가 지금처럼 사고를 뒤처리하는 부처로 인식되는 한 존립조차도 어렵다.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친근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대응, 수습, 복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예방이나 대비를 우선하는 선제적인 부처로 탈바꿈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하는데 5~7배의 비용이 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국민들은 그 만큼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인류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새로운 재난, 복합적인 재난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포함한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조직은 중간에서 질책을 받더라도 숙명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안전처가 하는 일이 미흡한 점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국민안전처를 질책하는 건 좋지만, 불속에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소방대원, 거친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해경대원들에게는 오히려 격려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송(宋)나라 때 어느 농부가 벼를 빨리 자라게 하려는 욕심으로 논에 심은 모를 잡아당겨 키를 키웠다고 한다. 하지만 벼는 모두 말라 죽었다. 바로 조장발묘(助長拔苗)의 고사성어이다. 빠른 성과를 보려고 무리하게 다른 힘을 더하여 도리어 그것을 해치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비를 참고 견뎌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재난안전 관리도 조장발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솥(鼎)의 세 발이 동일한 길이와 굵기로 만들어지기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민안전처를 지켜보는 언론과 국민들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기대해 본다.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