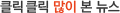나는 ‘루저’다. 그것도 한참 루저다. 남자는 키가 180cm가 넘어야 한다는 루저 논란에서 보면 그렇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앞 번호가 창피한 건 아니었지만, 뒤에 앉은 큰 키의 동급생을 보면 딴 세상 아이들 같았다. 그들은 더 남자다워 보였고 노는 물도 달라 보였다.
그 시절에는 키 순서에 따라 학급 번호를 부여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다보니 대체로 같은 번호대의 급우끼리 친하게 어울렸고, 학년 내내 한 마디도 말을 섞어보지 못한 키 큰 친구들도 있었다. 출입하는 문도 달랐으니까. 키 순서가 곧 번호 순서인데도 외모지상주의 논란이 없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의아하다.
이제 동창회에 가면 키가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는다. 그때는 엄청 커 보였던 친구가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다른 물에서 노는 거 같던 60번이 넘던 친구가 왠지 왜소해 보이기도 하고, 5번 안에 들던 키 작은 친구가 당당하고 커 보이기도 한다.
다들 번호 순서에 따라 우열이 있는 삶을 살지도 않았다. 나이를 먹고 보니 비로소 키에 대한 생각에서 해방된 것일까. 학창 시절에는 외모밖에 안 보였지만, 지금은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인다.
내 키가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 봤다. 어쩔 수 없는 유전자 탓에 나의 아이들이 훌쩍 크지는 않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내 인생에 키높이가 준 불이익은 없었던 거 같다. 키가 나의 직업과 인격과 결혼을 결정한 것도 아니었으니.
하지만 나 역시 키에 대한 편견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설 귀성 열차에서 마주친 많은 가족 중에 자기보다 키가 훌쩍 큰 아내를 동반한 남편을 보았다. 한번 더 쳐다보게 되었다.
저 남자는 무슨 능력이나 장점이 있을까, 저 여자는 주위의 시선을 어떻게 견디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나 자신을 탓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연휴 기간 중에 남자의 키를 소재로 삼은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다. 작년 말에 국내서 개봉했던 ‘업 포 러브’(Up for love, 감독 로랑 티라르)라는 프랑스 로맨틱 코미디다.
둘 다 이혼 전력이 있는 남녀. 여자는 176cm의 늘씬한 미인에 성품도 좋은 성공한 변호사다. 남자는 뇌하수체 이상으로 136cm에서 성장이 멈춘 건축설계사다. 키 하나 빼고는 늘 주변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당당하고 유머러스하고 젠틀한 남자다.
두 사람은 여자가 카페에 놓고 간 휴대폰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처음 대면하고 점차 서로의 매력에 이끌려 사랑에 빠진다. 처음 만났을 때 여자가 당황하자 남자가 말한다. “제가 40cm가 작은 게 불편한가요? 특이하고 놀랍긴 해도 별일이 아니죠. 전쟁이 나거나 입 냄새가 나야 큰일인 거죠.”
하지만 사회의 시선과 편견은 두 사람의 결합을 힘들게 한다. 나로 인해 상대가 불편해지는 것도 마음이 아프다.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그렇지 못하는 자신이 싫기도 하다.
남자는 힘들어하는 여자를 볼 때마다 계속 만나겠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상처받지 않을 기회를 준다. 여자는 결국 그를 떠나간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아버지에게 묻는다. “아빠는 키가 작은 게 화가 안 나?” “괜찮아. 키가 컸다가 작아지면 화가 나겠지만 다른 인생은 안 살아봐서 몰라.”
여자는 결국 다시 그 남자를 찾아가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당신을 사랑해요. 같이 살 준비가 돼있어요. 남의 시선이 쉽진 않겠지만 결정은 내가 해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나고, 이제 난 알아요.
난 이제 자유에요. 해방되었어요. 당신 목도 아프고 내 등도 아프겠지만 우리 함께 견뎌내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로맨틱 코미디의 전개는 사실 뻔하고 식상하다. 관객은 갈등과 반전 끝에 오는 해피엔딩을 기다린다. 이 영화도 그런 공식이지만 우리 주변의 고정관념과 편견, 그것을 극복해가는 갈등의 과정을 일상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곁들이며 과장되지 않게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전형적인 결말에 닳고 닳은 사랑의 이야기지만 나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즐거웠고 때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명백하다. 현대 사회의 외모 편견에 대한 비틀기다. 우리는 사회와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느라 정말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사는 게 아닐까. 프랑스 철학자 라캉의 그 유명한 말처럼, 나는 나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며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든 영화였다.
나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보기 싫은 게 하나 있다. 전동차 객실과 구내 벽면에 가득 붙어있는 성형외과의 ‘before’ ‘after’ 광고다.
진짜로 변한 모습일까, 컴퓨터 합성일까 하는 의심도 들지만 사람의 얼굴이 상품이 되고, 신체 부위에 가격이 책정되고, 몸에 견적을 내고, 그걸 별로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됐다는 게 싫다. 그런 광고를 보면 젊은 여성들을 흘낏흘낏 쳐다보게 된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주 쓰는 ‘얼짱’이란 말도 나는 불편하게 들린다. 여성단체들의 항의에 한때 그런 표현이 사라지는 듯했는데 이제는 아주 자연스레 쓰고 있다. 특히 운동선수에게 많이 쓰는데 운동선수는 못 생겨야 마땅하다는 말인가.
대중매체는 용모를 표현할 때 사려 깊어야 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과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것은 다르다.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지하철의 ‘비포, 애프터’는 폭력이다.
영화에서 결혼을 고민하는 그녀에게 친구가 이렇게 일갈한다. “너야말로 난쟁이야. 정서적 난쟁이. 틀에 박힌 편견 때문에 조금만 달라도 못 받아들이지. 그게 나치야. 세상이 나치 천지야.”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