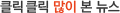조선 3대 명기名妓 애愛
기생妓生은 잔치 또는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등으로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자를 이른다. ‘말을 할 줄 아는 꽃’이라는 뜻으로 ‘해어화解語花’ 또는 ‘화류계여자花柳界女子’라고도 한다. 기생의 기본 신조는 ‘매창불매음賣唱不賣淫’ 즉 '노래를 팔지언정 몸을 팔지는 말라' 였다고 한다. 매춘 즉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춤․노래․기악․그림․글을 비롯한 학문은 물론 용모․화술 등 모든 것에 능통한 종합 예술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은 본인들 스스로 지식인이라 생각으로 정조관념과 매창불매음에 대한 신조가 강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있었기에 남편이 있는 경우도 흔해서 매음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원래 기생은 예술가로서 관아나 궁의 잔치에 동원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절대 매춘을 하면 안 되는 계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은 당연히 몸을 파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기생 학교를 ‘교방敎坊’이라 한다. 기생이 되는 일은 사대부들이 관직에 오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난이도가 높았다. 춤과 노래는 기본이고 급에 따라 판소리나 잡가, 민요는 물론 기악, 화술, 용모, 각종 재주 등 선비들처럼 공부해야 했다. 지역에 따라 말을 타는 재주도 배웠다. 모든 것을 잘해야 하는 게 기생이었다. 이렇게 해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우가 천양지차로 다르고 허락되는 예술 종류마저 제한되었다.
기생들에게는 '화초머리 올리기'라고 하는 일종의 성인식이 있었다. 교육을 받은 15․16세의 기생이 '첫 손님'을 받는데 처음 동침하는 남자가 머리를 얹어주는 것을 말한다. 화초머리는 초야권(첫날밤)을 얻은 남자가 가체加髢(가발)를 머리에 얹는 것으로 이는 일반 민가의 혼인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첫 손님의 자격 또한 상당히 중요했다. 명망 있고 직위도 높은 인물이어야 했으며, 비용도 많이 필요했다. 화초를 올려주는 사람이 가체는 물론 기생이 살 집과 세간, 장신구 등을 모조리 대줬는데, 가난하여 이를 제대로 대주지 못하면 그 기생의 앞날도 그리 밝지 않았다고 한다.
기생은 관청官廳에 소속된 관기官妓와 창가娼家에 소속된 사기私妓로 분류되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원칙적으로 관기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생 중에는 관기 외에 창가에 소속된 사기가 많았다. 구 한말에 이르러서는 기생의 수가 폭증하면서 그 등급을 일패一牌, 이패二牌, 삼패三牌로 구분하였다. 이 중 일패一牌를 기생妓生이라 불렸고, 이패二牌는 은근자殷勤者, 삼패三牌는 탑앙모리搭仰謀利라 불렸다. 기생은 일반적인 기녀妓女를 말하며 은근자殷勤者는 남몰래 매춘賣春을 하는 부류, 탑앙모리搭仰謀利는 매춘만을 업으로 삼는 부류를 일컫는다. 기생의 활동기간은 15세부터 50세인데 어린 기녀를 동기童妓, 나이 든 기녀를 노기老妓, 나이가 많아 퇴역한 기녀를 퇴기退妓라고 불렀다. 기생의 신분은 상당히 애매했다. 예술만 하는 기생은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매춘을 하는 사기私妓의 경우 천민으로 대우받았다. 하지만 일패기생은 예능인으로 많은 이들에게 대우를 받았다. 이패인 은근자는 기생이라 하더라도 두고두고 명기名妓라고 칭송받았다. 하지만 삼패기생인 탑앙모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천민으로 양반가와 정분이 나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서얼庶孼' 취급을 받았다. 송도 황진이黃眞伊, 부안 매창梅窓, 그리고 운초雲楚 김부용金芙蓉은 조선 3대 명기名妓이자 여류시인이다.
■ 황진이黃眞伊
기생 황진이黃眞伊(1511~1551)는 ‘진랑眞娘’이라고도 하며 기명妓名은 명월明月이다. 조선 중종 때의 시인이자 시대를 풍미한 명기名妓였다. 송도(개성)의 양반 황 진사進士의 서녀庶女로 태어나 우여곡절 끝에 기생이 되었다. 절색에 명창이었으며 시재詩才에도 능해 당대 최고의 기생으로 여러 가지 일화를 남겼다.
황진이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읽고 시詩·서書·음률音律에 뛰어나 뭇남자들의 시선을 받았다. 15세 무렵에 동네 총각이 황진이를 연모하다가 상사병相思病으로 죽었다. 총각의 주검을 실은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을 지나는 순간 움직이지 않았다. 황진이가 속적삼으로 관을 덮어주자 비로소 상여가 움직였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후 황진이는 기계妓界에 투신하여 문인文人·석유碩儒들과 교유하며 탁월한 시재詩才와 출중한 용모로 그들을 매혹시켰다.
황진이가 당대의 소리꾼인 선전관宣傳官 이사종李士宗을 만난 것은 운명이었다. 황진이는 이사종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딱 6년만 같이 살자, 3년은 선비님이 마련한 집에서 선비님이 생활비를 대고, 그 뒤 3년은 우리 집에서 제가 생활비를 대어 살자’고 했다. 이사종이 ‘그러마’고 약속을 했다. 황진이는 곧 바로 짐을 꾸려 이사종의 집으로 갔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약 결혼’이었다. 가사도 계집종을 두어 맡겼으므로 황진이는 고금에 없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꿈같은 신혼 생활을 즐겼다. 시부모를 봉양할 의무도 없었고, 남편을 위해 보따리 싸들고 고관대작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었다. 이사종과 6년의 결혼생활을 마친 황진이는 짐을 꾸렸다. 당황한 이사종이 울고 불며 매달려도 황진이는 매몰차게 계약결혼을 마쳤다. 당시 황진이가 이사종과의 열정적인 사랑을 읊은 시 ‘동짓날 기나긴 밤’은 오늘날까지도 애송된다. 청구영언의 황진이 시를 옮겨 적는다.
‘동지(冬至)ㅅ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소세양蘇世讓(1486년~1562년)과의 30일간의 사랑은 애틋하다. 그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풍류시인으로 전라도 익산에서 태어났다. 7살에 시를 지었고 18세에 진사에 합격했으며 23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전라도 관찰사와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형조판서, 호조판서, 병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거쳤고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에 올랐다. 소세양은 젊어서부터 여색을 밝혔다고 한다. 황진이가 절세미인이란 소문을 들은 소세양은 친구들에게 장담을 했다. 황진이가 절색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그녀와 30일만 함께 하고 깨끗하게 헤어질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만약 하루라도 더 머물게 된다면 너희들이 나를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좋다. 황진이를 만난 소세양은 30일의 약속으로 동거에 들어갔다. 마침내 30일이 되자 소세양은 황진이와 함께 이별의 술잔을 나누었다. 황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시 한 수를 소세양에게 써 주었다. ‘봉별소판서세양奉別蘇判書世讓’이다. 황진이의 시는 소세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 맹세한 대로, 사람이 아니라도 좋다.’며 다시 황진이 집에 며칠을 더 머물렀다고 한다. 친구들은 약속을 어긴 소세양을 인간이 아니라고 놀려댔다. 그래도 소세양의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한다.
종실宗室인 벽계수碧溪守 이종숙李琮淑은 세종대왕의 17번째 아들 영해군의 손자로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다. 이말을 전해들은 황진이가 ‘벽계수를 개성까지만 데리고 오면 그 다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라고 했다. 개성 인근까지 말을 타고 도착한 벽계수는 황진이의 다음과 같은 시조를 읊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 웨라 /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벽계수는 그만 황진이의 자태에 넋을 빼앗기고 낙마했다. 이것을 본 황진이가 벽계수는 명사가 아니라 ‘풍류랑風流郞’이라고 말하며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 연유로 이 시는 벽계수 '낙마곡落馬曲'으로 유명하다.
지족선사知足禪師는 천마산天馬山 지족암知足庵에서 30년 수행으로 생불生佛이었다. 지족선사가 30년간을 도를 닦았지만 황진이를 만나서 파계 했다고 전해진다. 황진이는 생불이라 불린 지족선사를 시험해보기 위해, 비 오는 날 소복을 입고, 흠뻑 젖힌 채 그를 찾아갔다. 비에 젖은 황진이는 지족선사 앞에 무릎을 꿇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난데없는 미녀의 출현에 지족선사는 적이 당황했다. 지족은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때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都露阿彌陀佛'이란 말이 생겨났다. ‘생불’이라 불리던 지족선사는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 파계승破戒僧이 되었다.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이 송도 부근의 성거산聖居山에 은둔하고 있을 때였다. 서경덕 인물 됨됨이가 소문났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비를 흠뻑 맞은(황진이의 계략) 황진이는 서경덕이 은거하고 있던 초당으로 찾아갔다. 서경덕은 황진이를 반갑게 맞았고, 비에 젖은 몸을 말려야 한다며 아예 황진이의 옷을 벗기고 직접 물기를 닦아주었다. 서경덕의 행동에 오히려 황진이가 부끄러워했다. 물기를 다 닦아낸 서경덕은 이부자리를 펴 황진이를 눕히고는 몸을 말리라고 했다. 그리고는 서경덕은 다시 글 읽기를 계속했다. 날이 어두워져 이윽고 밤이 깊었다. 삼경쯤(23시~01시) 되자 서경덕이 황진이 옆에 누웠다. 그러나 황진이의 기대와는 달리 코를 골며 잠을 자는 것이었다. 아침이 되어 황진이가 눈을 떴을 때 서경덕은 이미 밥까지 차려 놓았다. 황진이는 서경덕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옷을 곱게 차려 입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서경덕이 집에 도착했다. 역시 글을 읽고 있던 서경덕이 반갑게 맞이했다. 방에 들어선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큰절을 올리고 제자로 삼아달라고 간청을 했다. 서경덕이 웃기만 했다. 황진이가 서경덕에게 ‘송도에는 꺾을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번에도 서경덕은 웃기만 했다. 황진이가 말했다. ‘첫째는 박연폭포요, 둘째는 선생님이요, 셋째는 바로 저올시다’ 송도삼절松都三絶은 그렇게 황진이의 입을 통해 만들어졌다.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여러 유혹을 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후에 황진이가 감탄하여 ‘지족선사는 30년 수행에도 내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서경덕은 함께 오랜 시절을 지냈으나 끝까지 나에게 이르지 않았으니 진정 성인이다.’ 서경덕의 학문이 높음과 올 곧은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서경덕이 세상을 떠나자, 기생 일을 접고 은둔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황진이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죽으면 곡을 하지 말고, 상여가 나갈 때는 풍악을 울릴 것이며, 생전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남자들을 애태우게 한 죄가 있으니 관을 쓰지말라고 했다. 다만 자신을 송도 밖의 사천 모래밭에 던져 까마귀밥이 되게 해 방탕한 여자들에게 경계로 삼으라고 유언 했다고 전해진다.
황진이는 40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녀는 개성 어느 길가에 묻혔다. 세월이 흘러 개성에서 그녀의 무덤을 발견한 평안감사 백호白湖 임제林悌는 그녀의 부재를 슬퍼하며 시를 읊었다.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 홍안紅顔을 어데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 잔盞 잡고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설워하노라’고 한탄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황진이黃眞伊(절색), 서경덕徐敬德(절윤)이라고 말한다.
황진이는 남성위주의 시대를 휘저었고, 섹스는 언제나 본인이 선택했으나 헤프지 않았다. 시화에 능하고 풍류를 안 황진이는 서양 및 중국의 미녀가 단순히 미모로 권력자에게 몸을 맡기고 이름을 날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여인이었다. 후일 남자들이 황진이를 그리워하며 ‘자는가? 누웠는가? 라고 황진이를 흠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매창梅窓
매창梅窓(1573~1610)은 아전 ‘이탕종李湯從’의 딸로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이며 부안 기생이다. 가사와 한시 및 시조와 가무 그리고 거문고에 이르기까지 다재다능했다. 본명은 향금香今, 자는 천향天香, 매창梅窓은 호다. 매창은 계유년에 태어났으므로 계생桂甥, 계랑桂娘이라고도 한다. ‘매창집梅窓集’에 의하면 매창은 본래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스스로 매창이라고 작명했다. 매창은 조선의 평민시인 유희경劉希慶, 인조반정 때의 공신인 이귀李貴,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許筠 등 당대 문사들과 교유가 깊었다. 조선시대에 한시漢詩를 잘 쓴 시인으로 ‘북의 황진이 남의 매창’이다.
매창에게 사랑이 찾아온 것은 매창의 나이 스무 살 무렵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 봄날이었다. 전라북도 부안 사또가 한양에서 온 친구를 위해 향연을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훗날 조선 3대 여성 문인으로 불릴 부안 기생 매창과 서자 출신으로 예학의 최고봉이자 당대 최고의 ‘위항시인委巷詩人’(서얼․천민 출신으로 새로운 문학 장르를 개척한 시인)인 촌은村隱 유희경劉希慶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때 까지 예학에 몰두하느라 마흔 중반이 되도록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유희경이었다. 매창에게 한 눈에 반한 유희경은 매창보다 28살이나 연상으로 천민 출신이었다. 양반들의 사랑을 받으며 명성이 높았던 매창이 신분이 높지 않은 유희경에게 끌렸던 것은 천민 출신이라는 공감대와 서로 간에 시로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유희경은 ‘서경덕徐敬德’의 문우인 ‘박순朴淳’으로부터 당시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 같은 시인들과 ‘풍월향도風月香徒’라는 모임을 만들어 주도했다. 이 모임에는 천민 출신인 시인 백대붕白大鵬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희경과 백대붕은 시를 잘 짓기로 소문이 퍼져 ‘유백’이라 불리기도 했다. 남도를 여행하던 유희경은 부안으로 내려와 매창을 만났다. 매창의 매력에 빠진 유희경은 마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고 시로 표현했다. 그때부터 유희경과 매창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시를 통해 주고 받았다. 유희경에 문집에 실려 있는 시들 중에 매창을 생각하며 지은 시는 7편 정도가 있다. 배꽃이 비처럼 내리는 날 유희경은 부안을 떠나 서울로 갔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도 소식이 없자 매창은 유희경을 그리워하며 시를 지어 서울로 보냈다. 다음과 같은 시조다.
‘이화우梨花雨 흩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이 시조는 사랑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별이나 둘 사이를 가르는 거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듬해 초여름에야 매창의 시를 받아 본 유희경은 애간장이 끊어질 듯한 자신의 그리움을 담아 부안에 있는 매창에게 ‘그대의 집은 부안에 있고 娘家在浪州(낭가재낭주) / 나의 집은 서울에 있어我家住京口(아가주경구) / 그리움 사무쳐도 서로 못 보고相思不相見(상사불상견) / 오동에 비 뿌릴 젠 애가 끊겨라腸斷梧桐雨(장단오동우) ’ 라는 오언절구의 답시를 보냈다. 부안에서 짧은 만남을 가졌지만 이별 후에도 두 사람은 사랑을 잊지 못하고 서로를 무척이나 그리워했다. 만나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리움이 커진 유희경은 서울에 있어 부안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시로 읊었다.
유희경이 매창을 그리워했듯이 매창 또한 유희경을 그리워했다. 두 사람은 첫 만남이 있은 지 15년이 지나 다시 만났지만 짧은 재회의 시간이었다. 함께 시를 논했던 유희경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고 이것은 이들에게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 매창이 3년 뒤인 1610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유희경은 ‘3년 전만해도 다시 만나 즐겼는데 이제는 눈물이 옷을 함빡 적시누나’라며 매창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이름난 기생 매창과 천민 출신의 유희경은 신분과 28세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애틋한 사랑을 나누었다. ‘매창집’ 발문에 기록된 매창의 생몰 연대는 안탑깝게도 37세에 요절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런가 하면 매창과 유희경이의 사랑이야기는 유희경의 호를 딴 ‘촌은집’으로 판각되어 남해 용문사에 보관되어 있기도 하다.
10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유희경만을 그리워하며 살던 매창에게 두 번째 남자가 나타났다. 그가 바로 부안의 이웃 고을인 김제 군수로 내려온 이귀李貴였다. 이귀는 1557년(명종明宗 12)에 태어났다. 호는 묵재黙齋, 자는 옥여玉汝,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이율곡의 제자로 일찍부터 문명文名을 떨쳤다. 나중에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거쳐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이다. 임진왜란 때는 ‘삼도소모관三道召募官’으로 군사와 군량미 등을 모아 전쟁을 도왔으며 유성룡柳成龍의 종사관으로 전세를 만회케 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 후 김류金瑬 등과 인조반정仁祖反正을 주도하여 광해군光海君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책록冊錄되어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의 군호를 받았다. 이런 인물에게 매창이 마음이 끌려 그의 정인情人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귀와의 만남은 오래 가지는 못했다. 신해宦海를 떠도는 이귀의 입장에서 매창에게 안도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글 잘하고 가무와 탄금彈琴에 뛰어난 관기를 한 고을 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파적破寂삼아 귀여워하였다가 떠난 뒤에는 까맣게 망각해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두 번째 남자마저 떠나보낸 매창은 사랑의 덧없음과 인생사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매창은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매창이 교산蛟山 허균許筠(1569~1618)을 만난 것은 1601년 7월이었다. ‘이귀’가 1601년 3월에 전라도 암행어사 이정형의 탄핵을 받아 파직을 당하고 4개월이 지난 즈음 부안을 지나던 허균이 비를 피해 객사에 머물렀는데 매창이 거문고를 들고 찾아와 하루 종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를 읊었다. 이때가 허균이 33세, 매창은 기생으로서는 이미 늙은 나이인 29세였다. 허균은 매창이 이귀李貴의 정인情人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했다. 밤이 되자 매창이 자기 조카딸을 허균의 침소에 들여보냈다. 허균은 여자관계에 있어서도 유교의 굴레를 벗어 던진 사람이었다. 허균은 일찍이 '남녀의 정욕은 본능이고, 예법에 따라 행하는 것은 성인이다. 나는 본능을 쫒고 감히 성인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다, 여행할 때마다 잠자리를 같이 한 기생들의 이름을 자신의 기행문에 버젓이 적어놓기도 하였다.
매창과 허균은 주로 시를 중심으로 한 문장 교류였다. 허균과는 10년간의 인연이 존재하였지만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었다. 허균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허균이 시와 산문들을 모아 시부詩部, 부부賦部, 문부文部, 설부說部로 나누어 정리한 초고草稿)’에 매창과 시를 주고받은 이야기가 전하며 매창의 사람됨에 대한 기록을 덧붙였다. ‘성소부부고’에는 매창은 성품이 고결하여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허균은 매창의 재주를 사랑했고, 절조 높은 뜻을 헤아려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 관계를 유지했다. 허균은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였지만 매창의 시와 가무와 거문고에 반해 오랫동안 정신적 교분을 나눴다. 매창의 말년 시 세계가 ‘도선사상道仙思想’에 가까워진 것도 허균의 권유에 힘입은 바 크다. 허균은 매창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율시 2수를 지어 매창의 죽음을 슬퍼했다. 오늘날 매창이 시인으로 등극된 것은 1668년 매창 사후 58년 만에 부안의 아전들이 ‘매창집梅窓集’을 간행한 후 부터다. 부안 ‘개암사開巖寺’에서 출판한 ‘매창집’에는 주옥같은 매창의 한시 약 500여 수 중 현존하는 시 57수와 시조 ‘이화우’ 1수로 58수가 수록되어 있다.
■ 김부용金芙蓉
김부용金芙蓉(1812~1861, 49세)은 자는 운초雲楚, 호는 부용芙蓉으로 평안도 성천에서 가난한 선비의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김부용은 열 살 때 부친을 여의고 그 다음해 어머니마저 잃었다. 어쩔 수 없이 퇴기의 수양딸로 들어가 기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 김부용은 기생이었으나 예술과 시문에 빛을 발휘해 성도의 ‘설교서薛校書’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김부용은 이 같은 허명을 내던지고 금수강산을 유람한 후 문을 굳게 닫고 여생을 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녀를 이해해 주는 연천淵泉 김이양金履陽(1755∼1845)을 만나고 부터 여장부다운 시정을 담은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운초당시고雲楚堂詩稿’와 ‘부용집芙蓉集’에 300여 편이 있다.
김부용이 회자되는 이유는 당대에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다. 김부용이 성천기생으로 이름을 날리던 20대 후반이었다. 평안도로 유람 온 77세 김이양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연천 김이양은 예조․이조․병조․호조판서 등을 거쳤고 1826년 6월 72세에 벼슬에서 은퇴했을 때 순조 임금으로부터 ‘봉조하奉朝賀(정2품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이 관직에서 물러날 때 평생 녹봉을 받는 노후가 보장된 명예직)’를 하사받았다. 김이양은 평생 동안 꿈꾸던 산수 유람을 떠났는데 이때 평양에서 김부용을 만나게 된 것이다. 마침 대동강 연광정에서 평안감사 연회가 있었다. 평안도 관할구역 내 재임 중이던 김이양의 제자 성천부사 '유관준劉寬埈'이 기생 김부용을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면서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오니 대감께서 맡아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김이양이 대답하기를 ‘나는 77세에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 사양하겠다’며 그의 청을 거절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19세 김부용은 다음과 같은 말로 김이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뜻이 같고 마음이 통하면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에는 30객 노인이 있는가 하면 80객 청년도 있는 법입니다.’ 김이양은 김부용의 말에 탄복하고 받아들였다. 마침 김이양은 3년 전 부인을 잃고 혼자된 상태였기 때문에 김부용을 소실로 들이는데 큰 부담이 없었다. 덕분에 김부용은 ‘정실부인正室夫人’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김이양이 한양의 판서로 재수되어 몇 개월 떠나가 있을 동안 김이양을 그리워하며 시가 바로 ‘보탑시寶塔詩’다. 시는 탑 모양을 이루고 있어 ‘층시層詩’라고도 하며 ‘부용상사곡芙容相思曲’으로 유명하다. 다시 만나길 학수고대하던 김이양이 김부용을 불러 한양 남산 중턱에 신방을 꾸몄다. 이름하여 ‘녹천당綠泉堂'이다. 김부용이 26세, 김이양이 83세로 벼슬에서 물러나자 두 사람은 ‘원앙鴛鴦’ 처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만끽했다. 인연을 맺은 지 15년째인 1845년 이른 봄 김이양은 92세의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임종 시 김부용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는데 이때 김부용의 나이는 겨우 33세였다. 김부용에게 김이양은 사랑하는 남자이자 스승이었고 동지였다. 김부용은 그때부터 외부와 일체 교류를 끊고 고인의 명복만을 빌며 16년을 더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눈을 감으면서 ‘내가 죽거든 대감님이 묻혀있는 천안의 태화산 기슭에 묻어주오’ 유언을 남기고 녹천당에서 49년의 생을 마감하였다. 가난한 선비의 무남독녀로 태어나 기생으로 살아야했던 김부용의 기구한 운명을 김이양은 재능을 펼치며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해 주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타버린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나긴 밤을 새운 아름다운 불빛이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쓰러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지속이다’ 릴케Rainer Maria Rilke의 말이다.
․ 참고 : 조선 3대 기생은 ‘황진이, 매창, 김부용’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김부용’ 대신 ‘산홍’이라고도 한다.








.jpg)